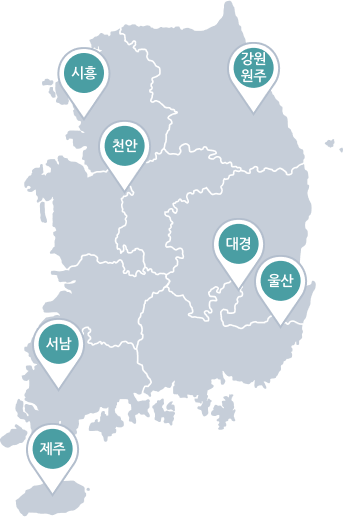3D 푸드 프린팅 기술은 디지털 디자인과 영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맞춤형 식감과 복합 소재 구성을 구현하며 대체식품 시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상업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대량 생산을 넘어 3D 프린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가치를 발굴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 데이터 품질과 보안 등 종합적인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한 표준화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출처: IT조선 권용만 기자
3D 푸드 프린팅, 산업화 위한 마지막 퍼즐은 ‘매력적 제품’
![[관련 보도] 3D 푸드 프린팅, 산업화 위한 마지막 퍼즐은 ‘매력적 제품’ 1 2023092148800 426878 418 v150](https://cdn.it.chosun.com/news/thumbnail/202510/2023092148800_426878_418_v150.jpg)
3D 프린터를 이용한 대안 식품의 제조는 이제 상상 속 기술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이를 대량 생산 단계의 상업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이상으로 3D 푸드 프린팅만이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1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