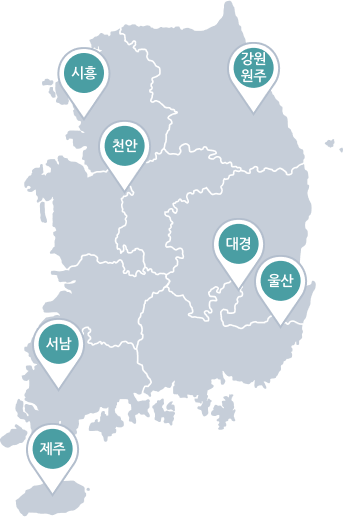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김진원 소령, 장진수 사무관, 김두영 주무관 팀은 ‘제3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에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중국산 드론 의존도를 낮추고 폭탄 투하용 드론의 기술 자립을 이뤄냈으며, 제작 비용을 시중가(3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150만 원으로 대폭 절감했습니다.
또한, 비접착식 조립 방식과 설계 표준화를 도입하여 야전부대에서도 장비 없이 즉각 제작 및 수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시 군수 보급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3D프린팅 부품을 실제 전투 장비에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미흡한 품질인증 행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진한 기자]
최강 성능에 값도 싼
![[관련 보도] 최강 성능에 값도 싼 'K드론' 육군이 만들죠 1 0005520322 001 20250706171710706](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7/06/0005520322_001_20250706171710706.jpg?type=w800)
국방 3D프린팅대회 장관상 수상 … 군수사령부 3인방 3D프린터로 폭탄 투하용 개발 기술 자립으로 중국 의존 낮춰 대당 150만원 가격도 절반